"타인의 삶을 훔친 것보다… 백만장자의 면책특권이 더 문제야"
아멜리 노통브의 소설을 비행기에서 읽는 것. 한때 그것이 내게 비행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때가 있었다. 적당한 길이, 적당한 위트, 적당한 무게감 때문이었는데 가령 인천공항에서 노통브의 책을 다섯 권쯤 싸 가지고 가서 히스로 공항에서 내릴 즈음 다섯 권 전부를 다 읽어 치우는 식이었다. ‘읽어 치운다’라는 표현은 작가에게 실례되는 말이지만 어쩐지 그녀의 책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1년에 책을 3.7권 쓴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쯤 되면 ‘쓴다’라는 동사보단 ‘써 제낀다’라는 말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매년 12월이면 그녀는 자신이 그해에 쓴 4권이나 되는 책 중에 어떤 것을 출간할지를 고른다고 한다. 한 번 고른 책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출판사에 보낸다. 매해 가을, 보졸레 누보가 나올 즈음, 아멜리 노통브는 연례행사처럼 책을 내는 셈이다.

소설을 쓰는 일은 대단히 정신적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나는 얼마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 소설가 역시 수많은 직업 중 하나이며 문학적 레토릭을 사용해 자신의 고통을 특권화시키는 태도는 어쩐지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이 저의 70번째 책이에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78번째 소설이 자라고 있어요" 같은 아멜리 노통브의 말을 듣다 보면 열등감이 생긴다. 언젠가 '보그'에 실린 아멜리 노통브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독특한 박력의 작가는 검은색 망토에 고딕 분장을 한 채 무표정하게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다. 거울 속에는 똑같은 아멜리 노통브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고 말이다. 이쯤 되면 아멜리 노통브 '쌍둥이설'을 설파하던 동료 작가의 가설을 믿고 싶어진다.
'왕자의 특권' 역시 꽤나 황당한 얘기다. 주인공 밥티스트의 집에 어떤 낯선 남자가 찾아온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 남자가 전화를 걸다 말고 이유 없이 자신의 거실에서 죽는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귀찮아진 남자는 죽은 남자의 신원을 알아보다가, 그가 베르사유에 살고 있는 '올라프 질더'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삶이 무료하고 외로웠던 밥티스트는 즉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나이와 체격을 가진 이 스웨덴 남자의 신원을 훔치기로 작정한다. 그렇게 그는 올라프가 타고 온 재규어를 몰고 죽은 남자가 사는 베르사유의 근사한 저택에 들어간다.
이제부터 밥티스트의 놀라운 삶이 펼쳐진다. 그는 죽은 올라프의 아내인 아름다운 지그리드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급 샴페인을 마시는 호화로운 삶을 이어간다. 올라프의 아내는 그가 남편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예의를 다해 그를 대접하는 것이다. 마치 최고급 샴페인과 초콜릿으로 매일 파티를 즐기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만찬을 훔쳐보는 듯한 풍경이다. 재밌는 건 이 소설의 배경이 '베르사유'라는 것이다. 베르사유가 어디인가. 태양왕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이 있는 파리 최고의 관광지 아닌가.
베르사유는 원래 루이 13세가 사냥을 위해 머물던 여름 별장으로 건축에는 적당치 않은 늪지대였다. 그러나 한 인간의 광기 어린 욕망이 질척거리는 늪지대에 화려한 궁전을 짓게 했다. 왕들의 광기는 사막 한가운데에 피라미드를 짓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인 타지마할을 짓게도 한다. 지금은 파리 외곽의 고급 주택가로 변모한 베르사유가 이 소설 속에선 최고급 샴페인인 '뵈브 클리코'와 '돔 페리뇽'이 젖과 꿀처럼 흐르는 대저택이 있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과거의 궁궐이 현대의 파라다이스로 재해석된 셈이다.

'르 푸엥'과의 인터뷰 기사 중 한 토막. 천하의 독설가인 외할머니가 그녀를 보자마자 했다는 말이 압권이었다. "아멜리, 너 정말 못생겼구나. 네가 똑똑하길 진심으로 바라마." 그런 외할머니를 둔 사람이 쓰는 소설이라면 아무리 괴상한 스토리라도 이해가 갈 법하다. 게다가 그녀는 컴퓨터가 아닌 볼펜으로 소설을 쓰고 있지 않은가.
"은행들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고객에게도 백만장자 고객에 버금가는 집착을 보인다. 특히 빚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다… 지그리드와 나는 지구상에서 제일가는 강대국들의 경제논리를 개인 차원에서 재현해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왕자의 특권,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소설의 맨 마지막 장에서야 그녀는 이 소설의 제목이 주는 의미를 유쾌하게 밝힌다. 아멜리 노통브의 말처럼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두는 것보다 더 굉장한 휴가가 있을까? 소설은 정답이라기보다 가장 매혹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 소설이 질문이길 포기할 때 그것은 완벽히 지루한 계몽서로 추락하고 만다. 당신은 누구의 삶을 훔치고 싶은가? 나로 말하면, 확실히 그렇다. 아멜리 노통브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다. 소설을 읽는 순간만큼은 나 역시 완벽한 밥티스트가 되어 올라프의 삶을 살았으니까 말이다. 소설에서나마 현대판 마리 앙투아네트가 되는 것도 꽤나 즐거운 인생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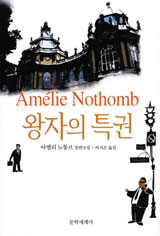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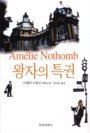 |
|
'유럽 > 프랑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프랑스 보르도 : '와인 천국' 보르도에선 썩은 포도가 더 귀하다? (0) | 2016.06.10 |
|---|---|
| 프랑스 파리 : 만남과 이별의 도시 (0) | 2016.06.09 |
| 자꾸 보아야 아름답다 (0) | 2016.06.09 |
| 프랑스 포르멘테라 : 시티 우먼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여름 휴가지 (0) | 2016.06.09 |
| 프랑스 파리 : 한번봤다고 다 본게 아니다 (0) | 2016.06.09 |
| 프랑스 리옹 : 현재의 그릇에 과거가 오롯이..글로벌 '컬처 시티' (0) | 2016.06.08 |
| 프랑스 그라스 : 소설 '향수'의 무대… 헤밍웨이가 사랑한 마을, 이야기 속 그곳을 걷다 (0) | 2016.06.08 |
| 프랑스 보르도 : 보르도에서 귀족의 유산을 만나다 (0) | 2016.06.07 |
| 프랑스 파리 :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의 그녀들, 꿈 하나로 이어지다 "줄리&줄리아" (0) | 2016.06.07 |
| 프랑스 파리 센강의 다리 - 파리의 다리는 관문이 되고, 설렘의 시작이 된다 (0) | 2016.0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