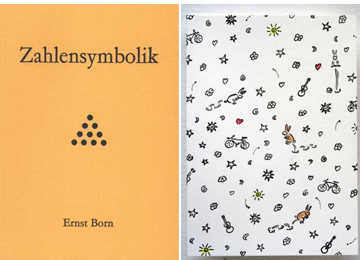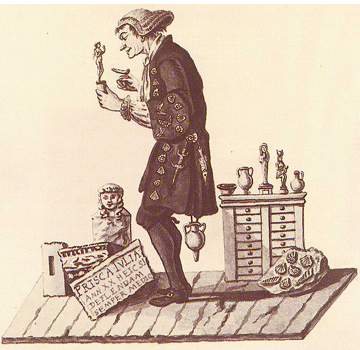|

|
|
|

|
|
|
|

|
|
|

|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은 비싼 것이 아니다. 작고 반짝거리는 것을 원할 뿐이다. 작고 반짝거리는 게 비싼 것은,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은 우연일 따름이다. 바젤에서는 1년에 한 번, 3월 말에서 4월 초경에, 작고 반짝거리는 것들을 위한 박람회가 열린다. ‘바젤월드’라 불리는 이 박람회에 모이는 것은 보석과 시계. 그뿐 아니다. 스트랩, 상자, 쇼핑백, 리본 등등 이와 관련된 모든 제품이 이곳에 모여든다. 1972년 스위스 산업박람회 안에서 열린 ‘유럽 시계 주얼리 쇼’에서 시작된 이 박람회는 2003년에 바젤월드라고 새롭게 명칭을 바꿨다. 표만 구입하면 일반인도 입장할 수 있는 이 대중적인 행사는 ‘월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45개국에서 근 2,000개에 달하는 업체가 참가하고 100여 개 나라에서 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관하는 이 행사는, 다루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가히 세계 최대의 시계 보석 박람회라 부를 만하다. 신제품 시계와 보석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독특한 부스들도 흥미롭다. 각종 시연이 벌어지고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왕래한다. 진귀한 시계는 예약을 하고 가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계들은 그 장소에서 직접 만져보고 착용해볼 수 있으니, 시계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여행가기 전에 일정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다. |
|
|

|
|
|

|
|
|
|
'유럽 > 스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위스 융프라우 : 야생화·잔디·낙엽·만년설… 76개 코스 오르다 보면 四季가 한눈에 (0) | 2016.06.01 |
|---|---|
| 스위스 베른 - 분수의 도시를 아시나요?? (0) | 2016.05.24 |
| 스위스 : 체르마트(Zermatt)를 제대로 즐기는 3가지 방법 (0) | 2016.05.24 |
| 스위스 : 새로운 몽블랑을 만나다! (0) | 2016.05.24 |
| 스위스 융프라우 : 2168m 절벽 위 아찔한 워킹… 동화 속 '알프스 천국'이 눈앞에 (0) | 2016.05.24 |
| 스위스 몽블랑, 샤모니 : 알피니즘의 기원이 된 몽블랑을 만나러 가는 길 (0) | 2016.05.23 |
|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 : 신이 빚어낸 알프스의 보석 (0) | 2016.05.22 |
| 스위스 레만호, 몽트뢰 - 아티스트들의 제2의 고향 (0) | 2016.05.22 |
| 스위스 몽트뢰 : 살아있을 때 갈 수 있는 천국.. 바로 여기..! (0) | 2016.05.22 |
| 스위스 제네바 : 어머 제네봐, 여기가 그런 곳이야 (0) | 2016.05.21 |